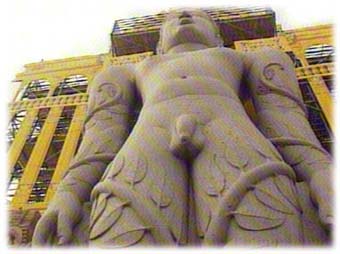|
| 자이나교 [ Jainism ] |
|
자이나교는 "마하비라"라고 불리는 한 위대한 인물의 깨달음에서 비롯된 종교이다. 자이나교의 전통에 의하면 마하비라는 "티르탕카라" 라고
불리는 선지자 계열의 24번째 계승자이다.마하비라의 본명은 바르다마나로서 기원전 540년에 지금의 인도 비하르주 지방의 바이샬리 부근의 마을에서
태어났다. 그의 아버지는 부처의 출가전의 이름과 똑 같은 싯다르타로서 유명한 크샤트리아계급의 우두머리였으며 어머니 트리샬라는 리차비족의 족장인
체타한 빔비사라 왕의 왕비였다. 이처럼 마가다의 왕족계급에 속하는 마하비라는 붓다와 마찬가지로 여려서는 왕족으로서의 호사스런 생활을 영위하다가
나이 30세에 출가하여 수행자가 되었다. |
|
자이나교는 다서가지의 가르침중에서도 생명있는 존재를 해치지 말라는 불살생 또는 불상해의 계율을 가장 강조한다. 그렇기에 후대의 자이나교도들은 땅속의 벌레들을 해칠까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오직 상업에만 종사하고 철저하게 채식위주로 생활했다. 이것은 후에 자이나교공동체를 인도에서 부유한 계층에 속하게 한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후에 자이나교는 흰색옷만 입는 쉬브탐바라(Shvetambara)와 어떠한 옷도 걸치지 않는 디감바라(Digambara)로 나뉜다. 그나누어진 이유는 기근으로 인한 수행방식의 차이가 빚어낸 어설픈 결과였으며 이때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한 측을 디감바라라고 부르며 수정을 가한 측을 쉬브탐바라라고 부른다. 마하비라는 사람들이 높거나 낮은 가문에 태어나는 것은 그가 전생에 지은 행위의 결과(카르마)때문인 것이다. 그렇다고 낮고 천한 계급에게 인간적인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전생에 쌓은 업에 의하여 현생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누구든 전생에 쌓은 카르마를 보다 빨리 해소하고 현생에서 더 이상 카르마를 쌓지 않는다면 모두 다 해탈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브라만종교와도 흡사한것으로 이후 자이나교가 별무리없이 힌두교에 흡수될수 있는 여지가 여기에 있다. |
| 또한 신분의 차이와 더불어 신을 인정하고 있는 것등이 힌두교와의 차별성이 흐려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서 결국 후대에 불교는 세계로는
번져갔으나 인도에서는 사라지고 자이나교는 세계로는 퍼져나가지 못했으나 지금도 그들의 명맥을 여전히 어느정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 재미있는
차이점이기도 하다. 그는 또한 제사의식이나 희생제와 같은 행위는 해탈에 도움을 줄수 없으며 오직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행위 그리고 올바른
믿음만이 진정한 깨달음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이점은 불교와 유사한 것으로 불교에서 말하듯 무엇엔가에 의존하여 자신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과 자신이 깨달음의 주체라는 것을 자이나교 또한 직시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교와 흡사한 부분으로 볼수가 있다.
자이나교는 다서가지의 가르침중에서도 생명있는 존재를 해치지 말라는 불살생 또는 불상해의 계율을 가장 강조한다. 그렇기에 후대의 자이나교도들은 땅속의 벌레들을 해칠까봐서 농사를 짓지 않고 오직 상업에만 종사하고 철저하게 채식위주로 생활했다. 이것은 후에 자이나교공동체를 인도에서 부유한 계층에 속하게 한 이유가 되기도 하였다. 후에 자이나교는 흰색옷만 입는 쉬브탐바라(Shvetambara)와 어떠한 옷도 걸치지 않는 디감바라(Digambara)로 나뉜다. 그나누어진 이유는 기근으로 인한 수행방식의 차이가 빚어낸 어설픈 결과였으며 이때 전통적인 방법을 고수한 측을 디감바라라고 부르며 수정을 가한 측을 쉬브탐바라라고 부른다. 마하비라는 사람들이 높거나 낮은 가문에 태어나는 것은 그가 전생에 지은 행위의 결과(카르마)때문인 것이다. 그렇다고 낮고 천한 계급에게 인간적인 가치가 없다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전생에 쌓은 업에 의하여 현생의 삶이 결정되기 때문에 누구든 전생에 쌓은 카르마를 보다 빨리 해소하고 현생에서 더 이상 카르마를 쌓지 않는다면 모두 다 해탈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브라만종교와도 흡사한것으로 이후 자이나교가 별무리없이 힌두교에 흡수될수 있는 여지가 여기에 있다. 또한 신분의 차이와 더불어 신을 인정하고 있는 것등이 힌두교와의 차별성이 흐려지게 만드는 요인이 되어서 결국 후대에 불교는 세계로는 번져갔으나 인도에서는 사라지고 자이나교는 세계로는 퍼져나가지 못했으나 지금도 그들의 명맥을 여전히 어느정도 유지할 수가 있었다는 것이 재미있는 차이점이기도 하다. 그는 또한 제사의식이나 희생제와 같은 행위는 해탈에 도움을 줄수 없으며 오직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행위 그리고 올바른 믿음만이 진정한 깨달음의 핵심이라고 주장한다. 이점은 불교와 유사한 것으로 불교에서 말하듯 무엇엔가에 의존하여 자신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과 자신이 깨달음의 주체라는 것을 자이나교 또한 직시하고 있고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불교와 흡사한 부분으로 볼수가 있다. 원시 경전에서는 비교적 상세한 교의가 정립되어 있으나, 그 이후로는 불교만큼 다채로운 발전을 한 흔적은 보이지 않는다. 후세에 와서
인식론이나 논리학은 불교의 영향이 현저한데, 오랫동안 산일되어 있던 불교의 작품들이 최근 자이나교의 승원에서 많이 발견되고 있다. 현재 교도
수는 인도 전역에 걸쳐 180만 정도밖에 되지 않으나 상호부조적인 성격이 강하고 상인이나 금융업자가 태반을 차지하고 있어 경제적 영향력 또한
막강하다. 그 실천생활상의 특색으로서 승려를 통하여 불살생(不殺生:Ahimsa)이 엄격하게지켜지고 있다. 교의로는 정신과 물질의 이원론을
주창한다. 즉 생명(jiva)과 비생명(ajiva)으로 이루어져 있고, 비생명은 다시 공(空:운동의 원리)·비공(非空:정지의
원리)·물질재료·허공·시간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본다. |